
바느질, 여자의 품격
해는 따서 겉을 하고 달은 따서 안을 하여
쪽지실로 상침 놓고 무지개로 선을 둘러
동대문에 걸어 놓고 올라가는 구감사야
내려가는 신감사야 중치 구경 하고 가소
그 중치 삯 몇 냥이냐 은도 천 냥 돈도 천 냥
구루 딸 은행씨랑 아지매 딸 수양씨랑
둘이 앉아 서로 지어 이천 냥이 삯이로다.
*중치: 중치막, 곧 벼슬 안한 선비의 웃옷
*구루: 꼬부랑 늙은이
위 노래는 칠곡군지 편찬위원회가 채록하여 1994년에 발행한 《칠곡군지》에 수록된 경북 칠곡에서 불린 <바느질 노래>로 여성들이 자신의 바느질 솜씨를 뽐내는 내용이다. 해를 따고 달을 따서 안을 하고 쪽지실과 무지개로 바느질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바느질삯이 이천 냥이나 된다고 하여 자신들의 바느질 솜씨가 대단하다고 자랑한다. 바느질이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자부심으로 견뎌 낸 것이다.
오랫동안 가문을 형성하여 종택을 이어 온 집의 종부들은 종부로서의 품격도 훌륭했지만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고 했다. 물론 종부가 아니라도 어느 집이나 안방 주인들은 옷 짓기에 능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 사회에서 바느질은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었으며, 바느질할 때는 마음가짐을 바로잡았다고 한다. 그래야지 바느질이 곱게 잘된다고 여겼다. 바느질 가운데서도 특히 혼수 이불을 만들 때 어머니들은 시집가는 딸을 위해 부정한 것을 가렸다.
대궐에서는 상의원尙衣院 소속으로 옷만 짓는 침선비針線婢라는 직책이 있었고, 양반 집에서는 침모針母를 따로 두고 부렸다. 이 침모는 같은 고용인인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으로 ‘반빗아치’ 또는 ‘찬비饌婢‘라고도 불렀던 찬모饌母나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안잠자기’보다는 위에 있었다.
한 집안의 생계를 이끌었던 삯바느질
바느질은 자기 집 식구들의 옷을 짓기 위해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마을마다 몇몇 가난한 집에서는 남의 옷을 지어 주거나 옷감을 짜 주고, 품값을 받아서 살기도 했다. 바느질 솜씨가 좋기도 했지만, 대부분 여성이 한 집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었다.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다가 남편의 몸이 성하지 못하거나, 과부 그리고 남의 농사를 지을 여건도 되지 않으면 소위 삯바느질이란 것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품값으로는 돈을 받기도 했지만 쌀, 좁쌀 같은 곡식도 받았으며, 바느질하는 것에 비해 품삯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다 근세에 오면 도시에서 ‘삯바느질’이란 간판을 내걸고 아예 직업적으로 나서는 곳이 많았다. 특히 ‘삯바느질집’은 명절이 다가오거나 혼사를 치를 집이 있으면 밤새 옷을 지어야만 했다. 이 ‘삯바느질집’은 옷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선도 겸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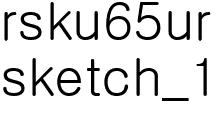
산업화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녀들의 고운 마음
그런데 1960~70년대까지도 흔하게 보이던 이 ‘삯바느질’이란 간판은 이제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었다. 산업화 이후 옷들이 대량 생산 되어 시장에 나오고 옷값이 싸졌으며, 한복이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서 ‘삯바느질’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이다.
몇 년 전 50해를 혼자 살아온 81살의 한 할머니가 삯바느질로 모은 30억 원 가량의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6.25전쟁 때 납북당하고 하나뿐인 아들은 어릴 적에 병으로 잃었다는 이 할머니는 삯바느질로 생계로 꾸리면서도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을 기증한 것이다. 이렇게 삯바느질을 하던 여인네들은 그들이 지은 옷만큼이나 마음이 고왔던가 보다.
'우리말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인이 말하는 한글, 아름다운 문장 18 소설가 손보미 편 마지막 문을 닫아라 (0) | 2013.11.27 |
|---|---|
| 문장으로 교감하다 - 프랑스에 전해지는 한국 문학 (0) | 2013.08.28 |
| 누구나 모두와 소통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말 다듬기 (0) | 2013.08.21 |
| 누구나, 모두와 소통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말 다듬기 (0) | 2013.08.07 |
| 기다림 망각 - 문인이 말하는 한글, 아름다운 문장 10 시인 오은 편 (0) | 201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