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의 삽화 속 제목이 두 개인 까닭
공부를 덜해 매 맞을까 두려워하는 아이와 이런 제자가 안타까워 미간을 찌푸리고 쳐다보는 선생님이 있는 서당 풍경, 어느 쪽이 이길까 아슬아슬한 마음에 졸았는지 부채로 가리거나 입을 크게 벌리는 소심한 아저씨들과 엿 파는 일에 열중하여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 씨름판, 각종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두 팔로 온 하늘을 품을 듯한 아이의 춤사위가 눈길을 끄는 풍속화들. 이쯤만 늘어놓아도 ‘아, 그 화가!’ 하며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 김홍도1745~1806? 혹은 1816?, 그리고 그가 그린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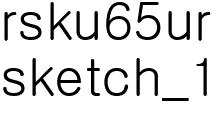
‘정조의 화가’로 알려진 김홍도는 왕조 시대 사람이자 도화서왕실의 시각 기록물이나 하사품을 그리는 곳의 직원이었다. 그의 모든 생산물을 이 테두리 안에 가둘 수는 없지만 왕에게 소속되었으므로 정조의 명 안에서 활동한 것을 전제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정조가 본보기로 삼은 왕은 세종이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서사시를 지어 보급했다. 또한 이륜행실도나 삼강행실도와 같은 윤리서에 그림을 곁들여 글을 모르는 백성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그림의 상단에 한글로 내용을 풀이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비록 책은 중국에서 건너왔을지언정, 그것을 접하고 읽는 이들은 한자를 모르는 우리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정조 역시 백성들의 윤리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오륜행실도의 출간을 지시했으며, 불교 경전이긴 하지만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그림을 곁들이고 글을 붙였다. 이 부분에서 활약한 것이 바로 김홍도다. 이 책은 정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출판되었으나 김홍도의 그림만큼 실감나거나 완성도 높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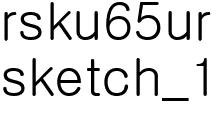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까지의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의 도리에 대해 자세히 다룬 책이다. 부모의 열 가지 은혜를 십대은十大恩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懷耽守護恩 회탐수호은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시는 은혜
② 臨産受苦恩 임산수고은 해산 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
③ 生子忘憂恩 생자망우은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④ 咽苦吐甘恩 인고토감은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⑤ 廻乾就濕恩 회건취습은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⑥ 乳哺養育恩 유포양육은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⑦ 洗濁不淨恩 세탁부정은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은혜
⑧ 遠行憶念恩 원행억념은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⑨ 爲造惡業恩 위조악업은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
⑩ 究意憐愍恩 구경연민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
기존의 것과 김홍도가 그린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가장 큰 차이는 ‘제목’에 있다. 기존의 책에는 중국에서 쓰는 한문만을 담고 있지만, 김홍도의 책에서는 한문을 우리말로 읽었을 때의 소리, 즉 음역한 것을 한글로 나란히 적어 놓았다. 글의 해석이나 내용은 따로 없이, 오로지 한문의 음역만 담겨 있다.
여기서 세종과 정조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 세종은 책에 실린 내용 전체를 한글로 풀이하여 적었지만, 정조는 ‘제목’에 쓰인 한문만 단순히 한글로 음역했다. 정조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종 같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시대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에게는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을 더 많은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었으나, 정조의 시대는 당시 세력이 강화되던 중국의 영향으로 다시금 한문이 중요해지던 시대였다. 즉 그림의 제목 부분에만 음역한 한글을 삽입한 것은 분명 그 시대의 한계였던 것이다. 오히려 당시로서는 책 속에 한글을 삽입한 것만으로도 진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선택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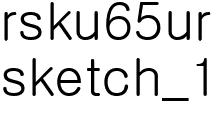
이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제시된 김홍도의 그림이다. 왼쪽 오른쪽 그림 모두 김홍도의 그림이다. 그런데 한쪽에는 한글이 제대로 드러나 있고 한쪽은 자리만 남긴 채 한글이 사라졌다. 왜일까? 정조 때에는 출판물의 간행이 그 어느 시대보다 활발했다. 김홍도의 그림으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을 처음 제작했을 당시에는 한글을 넣은 상태에서 목판을 제작했으나, 인쇄량이 급증하여 목판으로 인쇄가 어려워지자 금속판으로 다시 제작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글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몇 마디의 한글마저 유지되지 못했을 정도로 중국의 문자가 활개를 치는 시기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남은 것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형태의 한글이 깨끗하게 삽입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다.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수백 년 전에 남겨진 그림과 글을 함께 읽고, 그 뜻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당시의 조선이 그러했듯 오늘날 우리도 주변 나라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말글살이는 이 속에서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살아숨쉬는 우리말, 지역어 (0) | 2013.06.05 |
|---|---|
| 책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자 (0) | 2013.05.08 |
|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뷔페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0) | 2013.05.07 |
| 삐딱하게 읽고 정확하게 쓰기-문학 기자 최재봉 (0) | 2013.05.07 |
| 태산은 작은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 중국 편 (0) | 201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