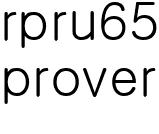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지요. 현대 사회의 정교한 시스템은 드러난 문제를 아니라고 덮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로 둔갑시킬 만큼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쉽게 이 눈가림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는 문제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름달 밝은 줄 몰랐더냐?”라고요.
환하게 밝은 보름달 아래 드러나지 않는 진실은 없습니다. 달은 누구에게나 밝고 어디서나 밝게 빛납니다. 오죽하면 “보름달 밝아 구황 타러 가기 좋다”는 옛말이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것은 서럽지만 그래도 곡식 꾸러 가는 발길을 비추는 보름달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한, 그런 발걸음이겠지요.
‘달의 날’이라고 하면 한가위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대보름’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곧 정월대보름이네요. 환하게 밝은 둥그런 달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명천지 어두운 구석 없이, 가리는 진실 없이 환하게 밝히는 그런 달 말입니다. 올해 달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밝게 떠서 온갖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남루함, 어리석음과 거짓됨을 일시에 밝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일년 세시절기 가운데 정월 대보름은 공동체의 으뜸 절기입니다. 대보름날은 마을 공동체가 가장 바쁜 날이지요. 각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도 있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 한 해 풍요를 기원하는 여러 일들을 행하는 것은 물론, 한 해의 시간이 시작되는 기점에서 온갖 액운을 몰아내고 좋은 일을 맞아들이려는 제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일 년 사시사철 중에 농사일이 가장 없는 한가한 때라 여러 가지 공동체적 놀이와 제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대보름날에는 지신밟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보름 준비는 그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대보름 때 마을 제사를 지내는 마을 공동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제사를 지내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물론이고 새마을 운동 시기를 거쳐 많은 마을 제사들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었지만 끈질기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 오거나 다시 마을 제사를 복원시킨 마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 년에 두 번 정월과 시월 상달에 제사를 지낸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월이나 상달에 한 번만 지내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도 젊은 사람들이 이어받지 않아 사라지는 마을들이 많지만 말입니다.
마을 제사는 동제洞祭라고도 하고 당제堂祭라고도 부릅니다. 성황제나 서낭제라 하기도 하지요. 마을에 따라서는 이를 구분해서 지내는 곳들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모시는 신은 보통 ‘당신’이나 ‘서낭신’, ‘성황당’ 등으로 부르는데 영남 일대에서는 ‘골매기’이나 ‘골막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당할아버지’나 ‘당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 당신은 마을 당숲이나 당산에 당집을 만들어 모신 경우도 있고 당산나무로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당제를 지내기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 혹은 14일이나 21일 전에 이 당집이나 당나무 주변에 붉은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칩니다. 당제를 지낼 때 제사상에 올리는 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에서는 미리 날을 잡아 술을 만들기도 하지요. 당제를 주관할 사람은 이때부터 매일 아침 깨끗한 물에 목욕재계를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더러운 것을 만질 때마다 다시 온몸을 씻고 새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를 ‘정성을 드린다’고도 하고 ‘정신을 드린다’고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으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밭에서 난 소출로 정성스레 제사상을 준비하여 정월 열나흗날 밤에 마을 제사를 지냅니다. 상당수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간단하게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당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마을 제사를 마무리한 후 새벽녘에 마을 입구나 마을의 동서남북에 세워 둔 장승이나 솟대, 혹은 별도로 만들어 둔 서낭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이나 공터에 모여 전날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윷놀이와 지신밟기를 즐기지요.
“서낭에 가 절한다”거나 “서낭에 난 물건이냐”는 등 서낭제에 관한 속담들이 많습니다. “지신에 붙이고 성주에 붙인다”거나 “터주에 붙이고 조왕에 붙인다” 등의 속담도 이와 같은 풍습에 연관된 말들이지요. 대보름 풍습과 풍경에 대해서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대보름 유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네요. 못다 한 말들은 다음 호로 미룹니다.
글_김영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구비 문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비극적 구전 서사의 연행과 '여성의 죄'>, <한국 구전 서사 속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경증 탐색>, <한국 구전 서사 속 '부친살해' 모티프의 역방향 변용 탐색> 등의 논문과 <구전 이야기의 현장>, <숲골마을의 구전 문화> 등의 저서가 있다.
'재미있는 우리 속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구리, 부활을 선언하다! -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 풀린다 (0) | 2014.03.12 |
|---|---|
|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 까마귀 열두 번 울어도 까욱 소리 뿐이다. (0) | 2014.02.28 |
| 섣달이 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겠다 (0) | 2014.02.03 |
| 재미있는 우리 속담 19 - 어차피 지난 일, 툭툭 털어 버려요! 가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0) | 2013.12.12 |
| 재미있는 우리 속담 18 사람이 그리워 살 만한 겨울 더우면 물러서고 추우면 다가든다 (0) | 201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