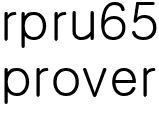
속담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집단적 지혜의 산물인 동시에 말놀이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언어유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탈춤이나 판소리 등의 사설과 재담에 속담이 많이 들어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면 더 많은 속담이 들어가 있겠지요. 판소리 가운데 가장 많은 속담이 나오는 것은 단연 <춘향가>입니다.
속적삼 벗겨 병풍 위에 걸어 놓고
둥뚱땅 법중 여로다.
초동아이 낫자루 잡듯
우악한 놈 상투 잡듯
사나운 상마 암말 덮치듯
양각을 취하더니
베개는 우구로 솟구치고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병풍이 우당퉁탕.
<김세종제 춘향가> 이난초 사설2013. 4. 20.
몽룡과 춘향이 첫날밤을 치르는 장면에서 서툴고도 열정적인 그들의 성적 놀음을 “초동아이 낫자루 잡듯, 우악한 놈 상투 잡듯, 사나운 상마 암말 덮치듯”이라는 속담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제 막 사랑의 감정과 성적 욕망에 눈뜬 사춘기 소년 소녀의 열정이 속담을 통해, 서툴면서도 뜨겁고 조급하게 굴어 더운 사랑스러운 정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용 가는 데는 구름 가고
범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군 님 가신 곳에 백년소첩 나도 가지.
몽룡과 춘향의 이별 장면에서는 사랑하는 낭군과 헤어지기 싫은 춘향의 마음이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라는 속담에 빗대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판소리 사설 후반부에서는 거지꼴로 돌아온 자신을 박대하는 월매에게 몽룡이, “동냥은 못 줄 망정 바가지는 왜 깨냐.”라는 말로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몽룡에게 옥중에 갇힌 춘향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라는 속담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장모가 차려 준 밥을 먹는 몽룡의 모습을 “먼 산 호랑이 지리산 넘듯, 두꺼비 파리 차듯, 중 목탁 치듯,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고수 북 치듯”이라는 속담에 빗대기도 하고 많은 양의 밥을 먹고도 탈 없이 소화를 잘 시키는 몽룡의 모습을 “무쇠토감을 끊어 넣어도 춘삼월 얼음 녹듯 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춘향이 앞에서는 살갑게 대하다가 춘향이가 갇힌 옥중을 벗어나자마자 사위를 박대하는 월매의 행동을 “오뉴월 보리단술 변하듯 한다.”라는 속담에 빗대기도 합니다.
판소리 <흥보가>에도 속담이 여럿 나옵니다. 환곡을 빌리러 관청에 들어가는 흥보의 행색을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 자 걸음으로 어식비식 내려간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곧 죽어도 양반’이라는 속담을 살려 허세투성이인 흥보의 행색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것이지요. 또 형인 놀부가 식량을 꾸러 온 자기 동생을 타박하며 “구지방 우리 안에 떼돼야지가 들었으니 네 놈 주자고 돝 굶기며, 식은 밥이나 주자 헌들 새끼 난 암캐들이 퀑퀑 짖고 내달으니 네 놈 주자고 개 굶기랴?”라는 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남 구하자고 제 집 돼지 굶기랴’, 혹은 ‘남 살리자고 제 집 개새끼 굶기랴’ 등의 속담을 활용한 것이지요.
제비 덕에 성공한 흥보를 보고 놀부가 “허, 그것 잘되야 먹었다.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깨 미꾸라지가 용 됐는걸.”이라고 말하는 대목이나, 제비를 기다리던 놀부가 날아가는 제비를 쫓으며 “저것 날아가 버리면 십 년 공부 허사로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속담이 판소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판소리의 유명세 덕분에 판소리에 들어간 어떤 표현이 속담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구술 문화의 영역에서 이런 넘나듦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언어적 표현이 그러하듯이 속담 역시 문화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우리 속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미있는 우리 속담 17 - 조심하세요! 어머니의 속이 시끄럽지 않도록 '장 단 집에 가도 말 단 집엔 가지 마라' (0) | 2013.11.13 |
|---|---|
| 15 가을철에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한다 - 죽은 이조차 꿈지럭하게 한 힘은 무엇일까요? (0) | 2013.10.08 |
| 판소리에서 들리는 속담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0) | 2013.08.28 |
| 소뿔도 각각 염주도 몫몫 - 처지에 따라 삶도 제각각 세상도 제각각 (0) | 2013.08.19 |
| 봄바람보고 춥다 하는 겨울바람 (0) | 201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