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가을철에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한다 - 죽은 이조차 꿈지럭하게 한 힘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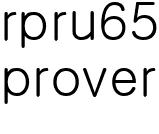
언젠가 경남 밀양의 어느 마을로 구전 이야기와 민요 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지요. 평생 자신의 땅이라고는 단 한 평도 가져 보지 못한 농투산이 였습니다. 당시에도 아픈 부인을 요양 병원에 데려다 놓고 이웃집을 전전하며 한 끼 한 끼를 해결해야 할 만큼 고단한 삶을 사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노래를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든이 다 된 나이였지만 이웃집까지 소리가 들릴 만큼 목청이 좋고 소리에 힘이 있었지요.
였습니다. 당시에도 아픈 부인을 요양 병원에 데려다 놓고 이웃집을 전전하며 한 끼 한 끼를 해결해야 할 만큼 고단한 삶을 사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노래를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든이 다 된 나이였지만 이웃집까지 소리가 들릴 만큼 목청이 좋고 소리에 힘이 있었지요.
1) 농투산이: ‘농투성이’의 방언
시골 마을에서 보통 이야기를 잘하는 분들은 마을에서 웃어른으로 대접받는 명망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일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민요에는 일노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논일, 들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는 모두 노동의 고단함을 덜고 흙과 땀 속에 삶의 여러 국면들을 차곡차곡 버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을 해 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일을 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리듬을 익히는 것을 꼽습니다. 언젠가 무거운 이삿짐을 나르던 아저씨가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요령의 핵심은 바로 리듬입니다. 민요의 리듬은 곧 노동의 리듬이며 삶의 리듬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배곯아 가면서 산에 가 나무를 하고, 가을이면 나락을 베던 시절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지겟작대기를 대신해서 파리채를 두들기는 할아버지의 손끝에서는 흥겹고 경쾌한 리듬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번지던 황홀한 웃음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경이로움을 느끼며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젊은 시절이라 한들 힘겹고 고단했던 시절 노동의 기억이 저토록 흐뭇하고 황홀한 것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지요.
지금 저는 그것이 바로 농투산이의 보람이고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일은 고되고 보상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땅이 주는 정직한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값진 명예로도 가늠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안겨 줍니다.
갑작스러운 개발로 땅을 팔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농민은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도 기어코 작은 텃밭을 일구어 내고야 맙니다. 흙을 만지고 흙에서 결실을 맺던 사람은 땅의 매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오쟁이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뼛속까지 농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흙의 힘이겠지요.
사실 세상 어떤 일이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줍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흘린 땀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쓴 일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거나 정을 쏟은 사람이 상처만 주고 떠나가는 일도 많지요. 그러나 땅은 언제나 정직하다고, 많은 농투산이들은 말합니다. 살뜰하게 보살피고 정직하게 일한 만큼 탐스런 열매를 안겨 주니까요.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가을 들녘의 아름다움은 늙은 농투산이의 얼굴에 번지던 황홀한 웃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을은 농투산이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계절입니다. 그들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쌀값 제대로 못 받고 땅 지키며 살아가는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도 수확하는 기쁨만큼은 다른 일에 비할 바 없이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단해도 몸 힘든 줄 모르고 땀 흘리며 노동에 열중하게 되는 겁니다. 수확 철 농사꾼의 일손이 얼마나 바쁘면 ‘가을철에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한다’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부지런히 날뛴다’거나 ‘가을에는 고상한 대부인 마님도 나막신짝 들고 나선다’거나 ‘가을철 농사일 바쁠 땐 친정 오라비도 반갑지 않다’는 속담도 있지요.
자고로 ‘농사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밭 타박 하고’, ‘농사 못 짓는 사람이 쟁기 탓 한다’고 했습니다. 밭이나 쟁기 탓하지 말고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 지금 손에 쥔 작은 결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얻지 못한 결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적으나마 내가 일구어 낸 성과를 흐뭇하게 끌어안는 것이 고단한 삶을 살아 내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